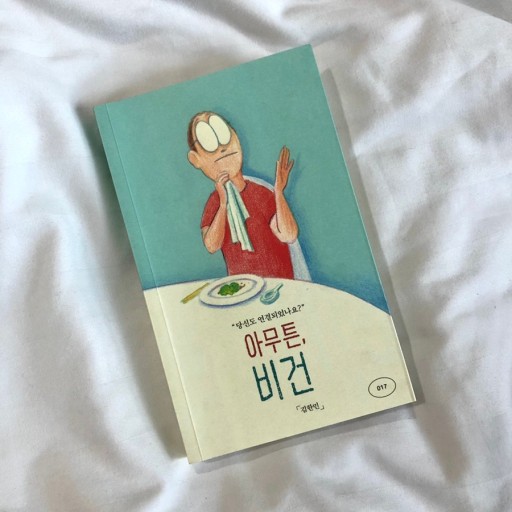
1. 이 나라에서 남의 위치란 참 묘하다. 한국인은 어지간히도 남 눈치를 보고 남 신경을 쓴다. 그렇다고 남을 배려하는 사회냐 하면 그건 아니다. 여기에 뜻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남이 존재한다. 전자의 남은 필요 이상으로 눈치도 보고 신경도 쓰고 과도하리만치 배려하는 존재다. 후자의 남은 마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며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다. 전자의 남은 '우리' 속에 포함되는 남으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할 때의 우리, 즉 가족, 친구, 회사 사람 등 어떤 방식으로든 이해관계의 사슬 안에 포함되는 남이다. 후자의 남은 테두리 밖에 남겨진 남이다. 길거리의 행인, (주로 저개발 국가 출신) 외국인 등 나와 직접적인 관게가 없는 무리다. 전자의 남에게 오버해서 친절한 만큼, 후자의 남은 무례하게 하대한다.
2. 팜유는 어떨까?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밀림이 파괴되면서 오랑우탄을 비롯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고 죽는다. 그렇다면 비건이 팜유를 먹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을까? 이렇게 확장하다보면 끝도 없어진다. 그래서 비건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완벽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진정한 변화를 이뤄낼 수 없다.
3. 한 비건 활동가이자 연구가는 주장한다. 완벽한 비건을 몇 명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다수의 사람들을 더 '비건적'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훨씬 효과적이라고. 동물을 살리는 데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공중 건강을 위해서도 말이다.
4. 동물과 자연을 좋아했지만 주로 상상의 세계에서였지, 현실에서는 단절되어 있었다. 나의 추상적인 감수성(아기 돼지 삼형제)과 구체적인 일상(돈가스)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생각도 못했다. 혹은 외면했다.
비건이나 비건식단에 관심이 많았는데, 메뉴를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았다. 간단하게 생각해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태반인데, 그렇지 않은 제외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이 불편을 야기했다. 그래서 아예 자리를 잡고, 메뉴를 고찰했다. <된장찌개, 버섯밥, 나물 비빔밥, 떡, 고구마, 토마토파스타, 나폴리탄파스타, 오일파스타. 스프링롤, 야채만두, 카레, 수제비, 칼국수, 감자전, 팽이버섯전, 김치전, 등등 전 , 야채볶음밥> 꽤 많지? 해서 난 계란이나 생선은 먹는 정도로 시작하려고 한다.
우유나 치즈는 원래도 거의 안먹었으니 걱정 없고. 사실 계란도 이전에 어디선가 하루 계란 1알인가 2알이 적정양이라고 들었는데, 난 하루 세끼를 꼬박 계란으로 떼우는 일도 허다했기에, 그 이후로 계란은 왠만하면 남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계란 반찬 만들기나, 모든 음식에 계란 넣기 금지. (그래도 계란이 어떻게든 떨어지면, 다시 구비해두긴 하고, 극단적이면 지속할 자신이 없다.) 자 일단, 이번주면 냉장고가 텅텅비니, 채식 식단으로 짜봐야겠다 기대된다 새로운 도전!
 |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의 호수 (0) | 2020.11.27 |
|---|---|
| 나는 장례식장 직원입니다 (0) | 2020.11.25 |
|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인물 관계도 (0) | 2020.11.23 |
| 왜 가족이 힘들게 할까 (0) | 2020.11.22 |
| 죽은자의 집청소 (0) | 2020.11.20 |




댓글